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회의든, 창의적인 소재를 찾기 위한 아이디어회의든 회의의 기본은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다. 회의 참석자가 입을 닫아버리면 제 아무리 잘 디자인한 회의도 시간낭비일 뿐이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회의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고위급 임원 등 의사결정권자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선호가 분명하거나 평소에 아끼던 직원이 내놓는 안을 선호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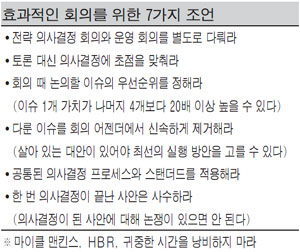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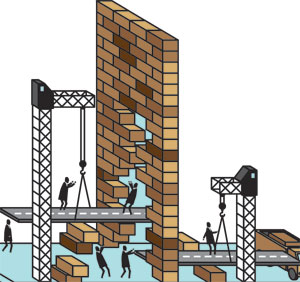
회의를 데이터 대신 정치가 장악하는 일은 의외로 흔하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회의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치를 잘하는 직원은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나머지 직원은 움츠러드는 일이 발생한다.
데이터회의는 정치를 막는 첩경이다.
마리사 마이어 구글 부사장은 디자인회의 때 "나는 이게 좋다"는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나는 이 웹디자인이 좋다" 또는 "나는 이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대신 "실험 결과 그 디자인을 채택하면 10% 더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한다.
회의를 주관하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최고결정권자가 얘기를 듣지 않고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말을 많이 하면 회의 참석자들은 입을 닫아 버린다.
"회의해봐야 결론은 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은 "회의를 하다 보면 의사결정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참석자들이 정답을 찾아가거나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CEO는 회의 때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오히려 회의 대부분을 훈계와 지시로 '교육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실로 최악이다.
인텔은 '원온원(One one one)'이란 회의 방식을 도입해 상급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들어와 떠들어대는 일을 막는다. 이는 회의가 필요한 사람이 같이 회의가 필요한 사람에게 회의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다.
회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회의의 어젠더부터 역할에 이르기까지 회의와 관련된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
원온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되며, 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없다.
"쓸데없는 회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직위를 막론하고 준비 없이 떠들어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이 입을 닫는 또 다른 이유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기 때문이다.
회의 때 자칫 말을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바로 이 리스크다.
회의는 복잡한 조직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없애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 '익명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기업도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박스닷넷은 회의 때 7분 동안 직원들이 포스트잇에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적도록 한다.
익명으로 쓴 포스트잇을 모두 벽에 붙인 후 직원들이 읽고 재배치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간다.
돈이 얼마나 드는 제안이든,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든 모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효율적인 회의는 회의 환경이나 물리적인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회의 문화가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CEO였던 스콧 맥닐리는 재임 기간 중 회의 때 파워포인트를 금지했다.
그는 "파워포인트를 금지한 이후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맥닐리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옛 OHP 방식의 슬라이드에 직접 손으로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을 하던 도중
"만일 내가 그리고 있는 도표나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했다면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딕슨 쉬와블 광고회사는 회의 때 직원들이 물총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누구라도 상대방 얘기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날리면 바로 물총 세례를 받게 된다.
"직원들이 비난받을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껏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이와는 완전 반대인 사례도 있다.
인텔의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는 회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인물인데,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회의에서는 일부러 비판을 많이 하거나 격한 논쟁을 하는 직원을 참여시켜 토론을 유도하기도 했다.
[황형규 기자]